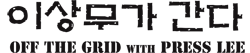김혜경(사랑의 어머니회 회장·아도니스 양로원 원장)
눈이 마주친 난이 할머니가 자기 방으로 오라는 손짓을 했다. 내가 외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다. 밤 잠을 설치셨는가, 할머니 두 눈이 벌겋다. 늘 활기 있는 모습으로 사셨던 할머니가 따님이 왔다간 후 며칠 간 시무룩해 있었다. 방문 왔던 따님이 떠날 때 방에서 나와 보지 않을 때부터 뭔가 마음에 걸리긴 했었다. 두 모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게 분명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어디 몸이 안 좋으셔요?”
내 말에 금세 눈시울이 붉어진 할머니가 풀 죽은 모습으로 말했다.
"우리 딸은 왜 점점 나를 싫어 할까? 내가 말 하는 게 모두 마음에 안 드나 봐."
그 표정이 너무나도 서글퍼서 할머니의 서운한 마음이 고대로 전해지는 것 같았다.
“아니예요. 할머니 따님이 얼마나 효녀인데요. 할머니가 정말 못된 것들을 못 봐서 그래요.”
난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저 가치관의 차이였다. 엄마는 딸이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가족을 이루기 원하지만, 딸은 혼자서도 충분하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독신을 고집하는 딸에게 그저 걱정 어린 질문을 했을 뿐일 텐데, 엄마의 ‘잔소리’가 사랑의 다른 표현이란 것을 왜 모를까. 가끔 딸에게 상처받는 할머니들을 위로하다 보면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나 역시 엄마에게 까탈부렸던 옛 기억들이 떠올라 마음이 쓰리다. 엄마의 평상 적인 질문을 왜 그렇게 날카롭게 대했을까? 엄마는 얼마나 서운했을까?
딸애를 만나는 것에 내가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한 건 몇 달 전이었다. 언젠가부터 서로 소통이 안되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어느 날 함께 식사를 하고 헤어져 집에 돌아오는 길에 문득 허탈함에 몸에 힘이 빠졌다. 내 옷차림을 지적하고 내 말에 반감을 표시하는 딸의 언행에 마음이 상했다, 마치 내가 세상에서 불필요한 존재가 된 듯해서 서글펐다. 그저 늙는 과정 이려니 하고 감정을 삭이려 했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다.
딸과 엄마의 관계는 참 묘하다. 같은 여성으로 같은 DNA를 공유하고, 서로를 가장 잘 아는 사이 같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관계다. 어릴 적 살갑던 시절의 추억을 버리지 못하면 말 한마디에도 마음을 다친다.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 두 세대 사이에 거리감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자녀들과 벌이는 감정싸움은 외로운 노후를 가장 힘들게 하는 요인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피폐해지는 쪽은 결국 엄마일 수밖에 없다.
올해 초에 나는 가족 대화방을 열었다. 딸의 까탈을 참느라 힘드셨을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글로 내용을 써 보내는 것이 오히려 소통이 잘 되지 않을까 싶었다. 예상은 적중했다. 우리 가족 네 명이 서로 소통하는 곳이 되었다. "뭐하니, 뭐 먹었냐?"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묻지도 않는 일상까지 시시콜콜한 글을 올려도, 짬짬이 서로 답글을 올린다. 도움을 청하면 각자 시간이 날 때 쉽게 해결해 준다. 엎드려 절 받기 같아도 서로에게 관심을 두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좋다.
한자로 '효(孝)’라는 글자는 ‘늙을 노(耂)"와 아들 자(子)’가 합쳐서 만들어진 문자다. 늙은 부모를 자식이 잘 받들어 모신다는 의미다. 그러니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은 당연지사다. 하지만 부모와의 소통이 어찌 그 들만의 문제일까. 자식이 아무리 받들려 해도 부모가 먹통이고 곡해하고 등 돌려 버리면 이 세상에 그 누가 효자가 될 수 있으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이들을 세상에 오게 한 것이 부모였듯이, 제 자식을 효자로 만드는 것도 역시 부모의 능력이 아닐까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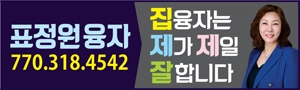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65세 미만 장애로 메디케어에 들어간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들](/image/290574/75_75.webp)
![[허니웨이 건강 칼럼] 프로폴리스편 3회- “아이도 괜찮을까요?”](/image/290140/75_75.webp)
![[내 마음의 시] 영수는 눈먼 영희를](/image/290454/75_75.webp)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이민자 삶의 역경을 이기는 힘](/image/290231/75_75.webp)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이민자 삶의 역경을 이기는 힘](/image/290416/75_75.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