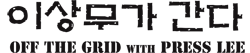김혜경(사랑의 어머니회 회장·아도니스 양로원 원장)
냉면 위에 얹힌 삶은 달걀을 입에 쏙 집어넣은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낯 선 번호였다. 얼떨결에 받은 전화 속 목소리를 듣자마자 ‘아차! 방심했구나.’ 반갑지 않은 사람이었다. 맛나게 먹으려던 달걀이 목에서 딱 걸렸다.
그의 전화는 늘 일방적이었다. 내가 그를 언제부터 알게 되었는지 확실하지는 않다. 맨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때, 당시 신문에 연재했던 내 칼럼을 읽고 전화 하는 거라 했으니 아마 7-8년 전 즈음이지 싶다.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이야기를 두서없이 풀어 놓고는 다짜고짜 해결책을 대라는 거였다. 글 쓰는 분이니 책도 많이 읽었을 테고, 그런즉 자신의 문제도 해결해 보라면서 저돌적이었다. 도와달라는 건지 싸우자는 건지, 자초지종도 알 수 없는 남의 인생에 무슨 해답을 내놓으라는 건가, 우물쭈물하는 사이 그가 먼저 전화를 탁 끊어버렸다.
그 후 잊을 만하면 전화가 왔었다. 번번이 제 할 말만 퍼붓고는 끊었다. 어떤 때는 내 속이 뒤집어져 확 전화를 끊고 싶었지만, 오죽 답답하면 생면부지인 사람에게 전화해서 한바탕 쏟아낼까. 그래, 어쩌면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속을 푸는 게 더 편할지도 모르지. 꾹 참었다. 인생길에 딱 맞는 해답이 어디 있나. 쭉쭉 뻗은 고속도로를 만나면 속도도 올려 보고, 풍광 좋은 산길에서는 쉬어가기도 하면서, 앞에 보이는 작은 빛 하나 바라보며 터널 속을 달리 듯 사는 게 인생지사 아니던가?
이번에도 그의 넋두리는 변함없었다. “ 세상에 기댈 곳이 없어서 너무 외로워요. 자식도 친구도 다 만나기 싫고, 그냥 누워서 천정만 바라보면 움직이기도 싫어요. 나는 너무 힘든 데 세상은 나와 상관없이 잘 돌아가는 같아서 너무 우울해요.”그의 머릿속에서 나는 가진 자이고, 누리는 자이고 행복한 사람이다. 그는 왜 제 인생길만 가시밭길이라는 생각을 할까. 사실, 돌아보면 내 인생길도 삶은 달걀에 막힌 목구멍처럼 퍽퍽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데. 되레 평생 돈벌이 없어도 살아가는 그의 삶이 부럽다고 소리칠 판국이다.
우울감은 누구에게나 있는 감정이다. 그럭저럭 일상을 해내려는 의지만 있다면 우울감은 질병이라기보다는 환경에서 영향을 받는 기분의 변화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며 속을 풀어내고 위로의 말이라도 한 마디 들으면 기분이 바뀔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전에 자신의 속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기분이 우울한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행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 습관처럼 우울 감으로 마음을 기울이는 것 은 아닌지도 살펴야 한다.
사십대 후반에 심한 우울감에 빠졌던 적이 있다. 인간관계에 회의가 일기 시작하더니, 마음이 너무 공허해졌다. 모임에 참석하면 우울감을 감추느라 짐짓 명랑한 척을 해야 했다. 친구가 부르면 한밤중이래도 달려 나갔던 내가 왜 이럴까? 갱년기 증상일까, 자괴감일까, 많은 생각을 했었다. 어느 날 책을 읽다가 무릎을 딱 쳤다. "사람은 스스로 선택하지 못할 때 절망을 느낀다. 그러나 가장 깊은 절망은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의 명언이었다.
맞다. 그 당시 나를 우울하게 했던 것은 모임이나 잘난 사람들이 아니었다. 마지못해 모임에 참석하고, 나보다 훨씬 잘나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꾸며낸 나의 위선 때문이었다. 무엇을 하고 살았든지, 무엇을 더 배웠든 가진 것이 얼마이든지 간에 그건 남의 것일 뿐이다. 남의 시선에 나를 맞추느라 지금의 즐거움을 놓치고 산다면, 이 순간의 작은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가장 억울한 인생이 아닐까. 지금 내 눈 앞에 있는 사람도 외롭지 않은 척, 행복한 척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는 지 누가 알랴. 인간지사는 모두 도긴개긴이다.
삶은 달걀은 껍질째 먹을 수는 없다. 퍽퍽해서 목에 걸릴지언정 삶은 달걀은 껍질을 깨야만 맛나게 먹을 수 있다. 자, 껍질을 벗기자. '삶'은 달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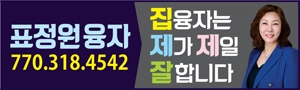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65세 미만 장애로 메디케어에 들어간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들](/image/290574/75_75.webp)
![[허니웨이 건강 칼럼] 프로폴리스편 3회- “아이도 괜찮을까요?”](/image/290140/75_75.webp)
![[내 마음의 시] 영수는 눈먼 영희를](/image/290454/75_75.webp)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이민자 삶의 역경을 이기는 힘](/image/290231/75_75.webp)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이민자 삶의 역경을 이기는 힘](/image/290416/75_75.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