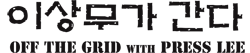김정자(시인·수필가)
며칠을 오락가락 비가 내렸다. 안개비 같기도 하고 때로는 가랑비로, 보슬비에 이슬비로 내리던 비가 한 밤이면 천둥 뇌우를 동반한 폭우로 돌변하기도 하면서 다양한 비의 모습으로 여름을 초대하는 계절의 전령처럼 찾아준 비에 친근감이 머문다. 가녀리게 곱게 내리는 비처럼 나직한 마음이 되어 남은 날들과 동행을 이어가고 싶어 진다. 비가 내리는 풍경 속에서 며칠을 보내는 동안, 창 밖의 궂은 날씨에 버금가는 먹거리로 찌부등한 마음을 다스려 보았 다. 파전에 김치전도 부쳐먹고 고구마를 쪄서 겉절이에 둘둘 말아서 먹어 보기도 하면서 천상 이국 만리에 와서 까지도 한국인의 먹거리 정서는 어쩔 수 없나 보다 하면서 한국인의 밥상 풍경을 떠올려 보게 되었다. 밥을 중심으로 한 한국인의 식문화는 단순히 먹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오랜 세월을 건너오면서 가족을 이어주는 이음줄이자 삶의 철학과 건강까지 어우러져 있다. 또한 어르신이 젊은이들에게, 손주들이 이웃 어른들에게 안부를 여쭙는 인사말 속에도 은은하게 스며들어 있다. ‘식사 하셨어요’ ‘밥은 먹었냐’ 하는 인사는 단지 허기를 채웠냐는 질문이 아닌, 포근하고 따숩은 마음을 전하는 방편이기도 했다.
우리네 한국인 밥상 문화의 주식은 밥이요 부식은 김치다. 먹거리가 풍부해진 현대에는 주식과 부식의 자리가 뒤바뀌기도 하면서 밥의 종류가 많아진 것 같다. 밥을 지을 때 넣어야 할 것이 다양 해졌다. 보리, 현미는 기본이요 귀리, 병아리 콩, Lentils, Quinoa, 율무 등으로 집집마다 밥 색깔이 여러 작품처럼 색색이다. 세상에 맛있는 것이 얼마나 다종다양한데 밥 타령이냐고 하겠지만 아직은 가족 모임에서나 지인들 과의 만남 등에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와도 냉장고를 열어 김치 한 점에 밥 한 숟갈을 덤으로 입맛을 돌려 놓아야 깔끔한 마무리가 되는 식사 코스를 유지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밥 심으로 살아가는 마지막 세대의 신토불이 한국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40여년 전 이민 초기엔 된장찌개 뚝배기 하나를 놓고도 이웃을 불러대며, 찬 밥 한덩이에 겉절이 김치 한조각을 척척 걸쳐 콧등에 송골송골 땀이 베이도록 거리낌 없이 나눠먹던 풍경이 떠오른다. 정답고 따뜻한 시간을 보냈던 그 날들이 얼마나 평화롭고 다사로운, 설렘이 깃든 아름다운 시간이었던지.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삶을 함께 한다는 숭고한 가치가 고여 있는 값지고 보람이 되었던 세월이었다. 그립다. 함께 했던 지인들이 묵묵히 제 갈 길로 흩어져 살고 있지만 밥 한 번 같이 먹자는 안부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한다. 이렇듯 나누었던 정들은 잊혀지지 않는 영상처럼 남겨져 있다. 이민 초기에 나누었던 정이 그립다는 말을 이구동성으로 40년지기 지인들과 속절없이 나누곤 한다. 모두가 가족이었고 크고 작은 일상의 대소사를 함께 짊어지고 살아왔다. 격의 없이 함께 나눈 밥 심이 낯선 이국의 삶을 견딜 수 있게 해 주었다. 마주한 밥상은 삶을 같이 하는 것으로 관계 맺음의 시작이자 진정한 사귐의 출발점이다. 밥상을 마주한 사람들은 그릇에 담긴 사랑 나눔이 마련되는 소중한 자리요 사랑과 믿음을 나누는 값지고 귀중한 삶의 자리이다. 다시는 만나 뵐 수 없는 부모님과 함께 했던 식탁이 떠오른다. 언제쯤 함께 다 모여질지 기약은 없지만 대가족이 함께했던 식탁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모두 다 함께 모이기에는 너무 방대한 가족이 되어버렸기에, 출가한 딸내 가족들과 손주들이 함께 어우러지며 소란스러웠던 밥상풍경을 떠올릴 때마다 아쉽고 연연한 그리움이 노구를 흔들어 놓는다.
이방인이 되기 전, 아이들이 어렸을 때 둥그런 밥상에 옹기종이 마주했던 시간들이 며칠전인 것 마냥 아련한 그리움에 젖어 들게 만든다. 딸들이 둥지를 떠나기 시작하면서 손주들이 밥상 식구로 등장하게 되었고 함께 밥상 풍경에 어우러지다 보면 더 이상의 행복도 기쁨도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원숙한 극묘 한 달관의 경지를 새롭 듯 맛보게 해주었다. 다 모였던 밥상은 소란하고 법석대긴 했지만 묵직한 그리움이 명치를 누른다. 밥상 내음은 본능적 그리움을 불러들이고 있었나 보다. 아련한 그리움이 향수를 불러들인다.
노부부가 함께한 밥상은 평화롭기는 하지만 언제나 조용하고 한가롭다. 오늘도 삼식이 할배와 삼순이 할매가 마주 앉아 밥을 먹는다. 하루 세 번, 한끼도 건너지 않으며 빈 둥지에서 열 두 해를 둘이서 함께 나란히 지켜왔다. 하루 세끼 따뜻한 밥에 5반 6반을 곁들이던 밥상이었는데 언제부터 인가 2반, 3반으로 줄이라는 할배 부탁에 준하면서 외식 이라고는 모르던 노 부부가 가끔씩 외식의 경지도 맛보는 와중에까지 돌입했다. 마켓 음식을 사먹으면 어떠냐는 할배 제의까지 들어왔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단호히 거절하면서도 언젠가는 그런 날이 도래할 것 같은 예감이 밀려든다. 한국인은 역시 밥 심을 누리는 민족이라서 밥 심 내력을 지켜내고 싶은 바램이 아직은 시들지 않은 체 이방인이 되어서도 굳이 지켜내려는 노심이 대견해 보인다. 마치 뿌리 사랑이라는 대단한 일을 염두에 둔 것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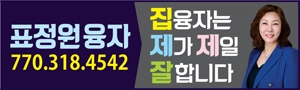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65세 미만 장애로 메디케어에 들어간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들](/image/290574/75_75.webp)
![[허니웨이 건강 칼럼] 프로폴리스편 3회- “아이도 괜찮을까요?”](/image/290140/75_75.webp)
![[내 마음의 시] 영수는 눈먼 영희를](/image/290454/75_75.webp)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이민자 삶의 역경을 이기는 힘](/image/290231/75_75.webp)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이민자 삶의 역경을 이기는 힘](/image/290416/75_75.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