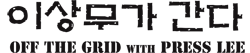김혜경(사랑의 어머니회 회장·아도니스 양로원 원장)
그날은 평소처럼 일상적인 날이었다. 점심을 먹고 잠시 산책을 나가려는 데, 전화기에 언니 이름이 떴다. 어?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고 있을 시간에 웬 전화지? 불안은 적중했다. 샌디애고로 가서 크루스 여행을 떠난다던 언니가 애틀랜타 공항에서 넘어져 병원으로 실려 왔다는 소식이었다.
처음에는 단순사고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언니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왼쪽 다리에서 3군데가 부러진 복합 골절이었다. 그동안 양로원에서 만났던 골절 환자들의 모습이 휙 떠올랐다. 골절 사고는 약속어음처럼, 나이에 맞춰서 본색을 드러내는 구나. 여러 가지 감정이 스쳤다. 언니가 겪었을 고통과 동시에 수술 후 치료와 재활의 힘든 과정을 잘 견뎌내야 할 텐데 라는 생각에 무력감과 걱정이 밀려왔다.
골절 사고의 후유증은 컸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증명하는 사람처럼 활발했던 언니의 모든 일상은 수술 후 한동안 정지되었다. 재활 과정을 겪으며 언니의 상태는 점점 나아졌지만, 예측하지 못한 일로 일상이 흔들렸던 경험은 언니의 자신감을 위축시켰다. 그러나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답답함 속에서 다시 걷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 또한 건강과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
오래 전 함께 지냈던 정 할머니 이야기다. 입소상담 중에 혼자 걸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양로원에 입소하려면 혼자 힘으로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워커나 지팡이에 의지해도 걷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사항은 주정부에서 정한 규정이라 꼭 지켜야 합니다. 아마도 양로원보다는 양로병원을 찾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라는 내 설명에 한국인이 모여사는 양로원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이 마지막 소원이라는 할머니의 인생사가 구구절절했다. 외로운 삶이었다. 난감했지만. 왠지 도와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일었다.
“할머니, 양로원 수속하러 오실 때 제 앞에서 혼자 다섯 발자국만 걸을 수 있을까요?” 나도 규정을 어기는 것이 아니니 괜찮겠다 싶었다. 그 말을 듣자마자 할머니는 다섯 걸음만 걷게 해달라고 의사에게 매달렸다. 그 당시 겨우 반 년 정도 버틸 수 있을까 싶은 85세 할머니의 의지력에 감복한 의사와 스텝들이 발 벗고 나섰다. 결국 한 달 후 찾아온 할머니는 두 팔로 워커를 꽉 부여잡고는 휘청거리는 두 다리로 다섯 걸음을 떼었다.
하지만 입소 후 할머니는 돌변했다. 평생 운동이라면 십리를 도망쳤다는 할머니 일상은 침대와 식당 그리고 TV가 전부였다. 다리 근육이 모두 빠져버리는 건 순식간인데, 무슨 대책을 세워야 했다. 할머니의 여동생에게 전화를 넣었다. 할머니가 평소에 뭘 좋아했는지 물었다. “쇼핑이지요. 거의 매일 옷 쇼핑 다니고 매년 자동차를 바꿔 타는 재미로 평생 살았어요.”라는 대답이었다.
옳거니! 이 지역에서 제일 큰 쇼핑몰로 데리고 갔다. 카트를 잡고 매장을 돌라고 했더니 얼굴에 배시시 미소가 피어났다. 갈 때마다 걷는 시간을 십 분, 이십 분, 한 시간으로 늘렸다. 두 달 정도 지나고 나니, 흔들거렸던 할머니의 두 다리에 힘이 생겼다. 양로원 입소 당시 겨우 6개월 정도 연명할 것 같다는 의사 소견과는 달리 할머니는 6년을 더 살고 92세에 가족병인 천식으로 떠나셨다.
걷는다는 것은 일상적인 행위지만 거리와 거리 사이를 움직인다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다. 독립성과 자존감의 표현이다. 내 삶을 영위하는 자긍심의 행위이자 다른 이들에게 내가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다. 하지만 그저 존재하는 공기처럼 너무 당연해서 나의 무게를 지탱하고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그렇다. 두 다리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깨닫는 순간은 활력을 잃고 나서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햇빛 아래 멍하니 앉아 있는 것보다는, 어깨를 펴고 허리를 곧게 세우고 스스로 걷는 일이 훨씬 더 인간적이지 않은까? 지금 당장 시작해 볼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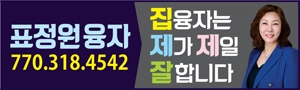

![[한방 건강 칼럼] 접지(Earthing, 어싱), 자연과 연결되는 작은 습관](/image/290710/75_75.webp)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65세 미만 장애로 메디케어에 들어간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들](/image/290574/75_75.webp)
![[허니웨이 건강 칼럼] 프로폴리스편 3회- “아이도 괜찮을까요?”](/image/290140/75_75.webp)
![[내 마음의 시] 영수는 눈먼 영희를](/image/290454/75_75.webp)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이민자 삶의 역경을 이기는 힘](/image/290231/75_75.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