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살이란 나이는 참 애매한 나이였다. 스무 살 초반의 사람들과 어울리기에는 너무 많고, 스무 살 후반의 사람들과 교감하기에는 너무 적은 나이였다. 그렇다고 내 자신을 스무 살 중반에 끼워 맞추고 싶지는 않았다. 25살을 1년이나 남겨놓은 시점에서 왠지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유야 어찌됐건 24살의 애매함과 불확실성 속에서 나는 혼란스러운 1년을 보냈다. 어쩌면 그 불확실성 속에서 내가 찾고 있었던 것은 내가 속할 그룹이 아닌 내 자신이었을지도 모르겠다. 혼란스러운 24살의 끝자락에 난 군에 입대했다. 애매한 나이는 그곳에서도 여전히 날 괴롭혔다. 함께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마다 나를 형이라고 불렀지만 막상 나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 서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어딘가가 불편했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나는 전남 진도로 자대배치를 받고 떠났다.
예상했던 대로 배치 받은 생활관에서 나는 가장 나이 많은 막내였다. 열심히 일해도 인정받기 힘들고, 일을 못하면 구박받기 좋은 그런 위치였다. 같은 실수를 해도 나이가 어린 동기들은 몇 번 혼나고 말았지만 나에게는 나이 먹고도 이것밖에 못한다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하지만 이등병 생활이라는 게 어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쉽게 넘어갈 수 있던가. 나이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이등병에게 군대는 항상 어려운 곳이었다. 특히, 춥고 배고픈 혹한기 훈련 때는 더욱 견디기 힘들었다.
훈련의 마지막 날은 유난히 바람이 차고 거셌다. 지난 닷새 동안 추위와 사투를 벌이며 간신히 버텨왔지만 오늘만큼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40km 행군은 끝이 없어 보였다. 그러나 난 그저 나이 많은 이등병에 지나지 않았고, 노쇠한 당나귀처럼 대열을 따라 터벅터벅 걷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발 아랫부분이 욱신거리더니 이내 걷기가 힘들만큼 통증이 심해졌다. 휴식시간에 전투화를 벗고 발 아랫부분을 들여다보았다. 온통 물집이 잡혀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다. 귀동냥으로 듣고 양말 두 켤레를 겹쳐 신었던 게 화근이었다. 오래 걷다 보니 양말과 양말 사이에 공간이 생겨 발바닥에 가해지는 마찰이 심해졌던 것이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난 힘없이 군장에 기대어 빛이 소멸되어 캄캄해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때였다. “두형, 힘들지? 이거 먹고 조금만 힘내.” 평소 무섭기만 했던 선임이 내게 뜨듯한 닭죽 한 그릇을 내밀었다. 장시간의 행군으로 인해 배가 고팠지만 내게는 닭죽보다도 “두형”이라는 이름이 더 친근하게 다가왔다. 마치 김춘수의 시, 『꽃』의 한 구절처럼 정말이지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그에게로 가서 두형이 되었다. 이제까지 나의 모든 행동들이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면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자 난 꽃이 된 것이다. 그날 이후 신기하게도 모든 사람들이 나를 두형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내 이름 박선두의 마지막 글자인 두와 나이 많은 사람을 높여 부르는 형이라는 두 단어가 만나 나이의 애매함을 말끔히 해결해주었고, 나아가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친밀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이곳이 군대이기는 해도 여전히 난 그들의 형이었고, 그들은 날 좋은 친구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김춘수의 시에서 애매하고 불확실했던 것들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꽃이 된 것처럼 그들이 나를 두형으로 불러주었을 때 나는 비로소 온전한 내가 되었다.
거짓말처럼 그 후로 내가 살고 있는 생활관에는 나보다 나이 많은 후임들이 연달아 들어왔다. 스물 후반의 초등학교 선생님부터 서른 살 치대생까지 모두 나보다 연장자였다. 연세 많은 후임들 덕분에 내가 어려진 것은 좋았지만 앞으로 나를 두형으로 불러 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은 아쉬웠다. 이제는 전역 하고 미국으로 돌아온 지도 꽤 되었지만 내가 꽃이 되도록 해준 이름 두형, 그 이름이 지금도 가끔씩 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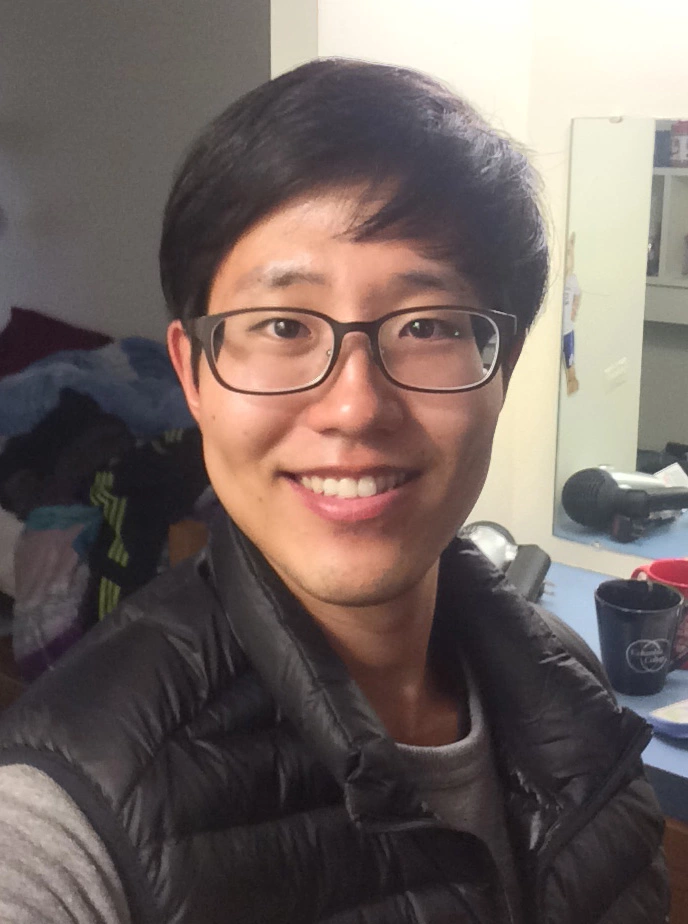







![[삶과 생각] 지난 11월5일 선거 결과](/image/278470/75_75.webp)
![[내 마음의 시] 통나무집 소년](/image/278259/75_75.webp)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메디케어 혜택의 신청](/image/278430/75_75.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