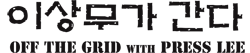박경자(전 숙명여대 미주총동문회장)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 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
영변에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실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 걸음
놓인 그꽃을
사뿐히 즈려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 시, 김소월, 1902--1934)
김소월의 시 ‘진달래 꽃’은 온 국민의 마음에 담아온 단연 일위의 시이다.
지금쯤 산과 들 바위틈에 연분홍 치마 폭을 휘감은 사랑의 화신이다.
내 어린 시절 ‘다산 초당’ 기암 절벽을 빨갛게 휘감은 진달래 꽃을 입이 빨갛게 따먹고, 치마폭에 가득 따서 어머니께 갖다드리면 어머니는 그 꽃으로 진달래 주를 만드셨다. 몸에도 좋다는 진달래 꽃은 우리 민족의 혼을 담은 꽃인가…
이 봄에 복사꽃, 배꽃, 꽃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이 없는 내 고향의 이 봄날에 온 국민 마음에 꽃피는 봄을 잃어 버렸다.
조국의 시련이 가슴 아파 이른 아침 비에 젖은 솔숲을 거닐며 솔등을 어루만지며, 옛선비님의 가슴을 느껴본다. 침묵의 솔, 인고의 세월에도 청푸른 잎새들, 하늘 향한 무언의 기도 소리, ‘천인 무성’ 그 우뢰같은 침묵…
내 마음에도 아직 봄이 오질 않았다. 한 쪽의 글도 마음에 쓰여지지 않아 푸른 솔에 등기댄다.
아픈 겨울을
가슴으로 앓은
침묵의 푸른 솔
그 맑은 파도 소리
'천인 무성'
그 우뢰같은 침묵
그 푸른 절개
그 맑고 푸른 기상
그 정직한 마음 하나
간밤에 파도 처럼
솔이 울더니
노오란 수선화 곱게 피었네
만물을 보듬은 깨어 사는
그윽한 선비의 향기 (푸른 솔, 박경자)
자연 속에는 깨어사는 생명의 혼, 하늘의 지혜의 소리가 들린다.
‘자연은 형체없는 깨어있는 무의 소리다. 그 지혜는 우둔함 같고 뛰어난 말 솜씨는 더듬 거리는 것 같다. 그 서투름은 추위를 이기고 고요함은 열기를 이긴다. 그 맑은 청정은 천하의 천하에 도니라.’ ( 노자의 도덕경)
내 조국의 아픔을 보면서 대한 민국 건국 이래 우리 민족이 처음 겪는 수치 스런 민족의 화 인것 같다.
수많은 역사의 아픔을 겪으며 살아온 조국, 이제 좀 살만한 나라인가…했는데 이러다간 민족이 망하겠구나… 가슴 아프다.
작은 여인의 치마폭에 싸여 국민의 가슴에 총을 겨누는 개엄을 선포하고도 파렴치하게 웃으며 어깨를 펴고 활보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자격도 없거니와 한 치의 자존감도 없는 한낱 졸개의 남자도 아니란 생각에 가슴 떨린다.
국모? 누가 과연 국모란 말인가?
산골마다 무당이 굿을하는 굿판으로 나라를 망친 ‘줄리’라는 한 여자가 대한 민국, 국가를 한 손에 쥐고 흔드는 어처구니 없는 정치 판을 손에 쥐고 흔드는 국가는 지구별 어디에도 없었다.
거짓으로 꾸며 쓴 숙명여대 석사 학위는 모든 것이 남의 글을 인용한 허위 위조지폐였다. 120년 민족 사학에 숙명인 한 사람으로 분노를 금치 못한다.
사랑하는 숙명 후배인 장윤금 총장은 대선배님들이 허위 석사학위를 늦게 처리했다는 이유로 사표를 처리했다.
대통령 관저에 온갖 무당들을 초청하여 굿을 하고, 스스로도 무당 역할을 했다.
하늘은 무심한 것 같지만 단 한치의 거짓도 숨길 수 없음을 알아야한다.
거짓 종교인들까지 합세하여 동조하는 현실의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
무엇이 과연 나의 조국을 이 지경까지 이르게 했는지가 의심스럽다.
산과 들이 꽃동산인 이 봄날에 과연 무슨 일인가…
나라 없는 설움의 일제 치하에서도 이런 때는 없었으리라.
물질만능주의가 가져온 온 정신적 빈곤의 사회, 우린 과연 잘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민족의 혼과 정체성이 뿌리째 흔들리는 오늘의 한국에 우리 모두 커다란 각성이 필요한 때이다.
일류 대학을 나온 최고의 지성인들이 선한 국민을 인질로 잡고 정권을 휘두르는 민주주의는 왜 필요한지 모른다. 링컨 대통령은 초등학교도 다녀본 적이 없다.
국민을 사랑하는 국민에 의한 참된 지도자를 국민은 원한다.
인촌 선생님은 시간만 나면 잔디밭에서 잡초를 뽑고 계셨다. ‘왜 선생님은 사람을 사서 풀을 뽑지 않고 손수 뽑으세요?’ 학생이 묻자, 우리 학생들이 내가 풀을 뽑는것을 보고 자라면서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지 않을까해서 이 일을 하는 걸세 하셨다 한다. ‘콩 심은데 콩나고, 팥심은데 팥난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사는 모습 그대로 닮는다.
사람의 가슴에 사랑이 식어버린
불모지의 땅에도 봄은 오는가
찢어진 지폐 한장의 값에
하늘 같은 가슴들이
팔리고 끌려가는 수인의 처참한 눈빛들
진달래 꽃이 피고 지는
이봄에 사람의 가슴에만 왜 꽃이 피우지 않는가?
누가 과연 보았는가 한민족의 설은 가슴에
그 눈물을 보았는가?
선하디 선한 국민의 가슴에 총 뿌리를 겨누고도
웃으며 활보하는 대통령은 과연 누구인가--
선하디 선한 민중의 한의 눈물을 보았는가 --
우린 선한 국민을 인질로 잡고
국민의 가슴에 총 뿌리를 겨누는
지도자는 용서할수 없다
우리 한 민족을 가슴에 부여안고
함께 웃고 , 함께 웃을 수 있는
나의 아픈 가슴 그 눈물을 함께 울고 웃고 싶은
선한 눈매의 그 한사람이 너무 그립다.
죽은 자의 옷을 입고 사는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남기고 싶은
유언은 과연 무엇인가
새 아침을 기다리는
온국민의 한의 목마름
그대는 알고나 있는가 (시, 박경자, 우린 왜 사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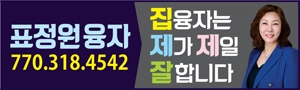

![[정숙희의 시선] 샴페인에 200% 관세라니](/image/282111/75_75.webp)
![[삶과 생각] 충격과 갈등과 회개](/image/282125/75_75.webp)
![[수필]동백 아가씨](/image/281924/75_75.webp)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메디케어 파트 D의 디덕터블](/image/282063/75_75.webp)